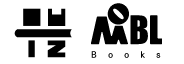그래도 사랑할 만한 인간, 살 만한 세상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 이문열 세계명작산책 10. 그래도 사랑할 만한 인간]
유복한 귀족가문 출신 톨스토이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스스로 세계와 인생을 다 이해했다고 믿은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한껏 자신에 차고 시건방져 있던 시절 나는 톨스토이를 경원했다. 그가 준 감동들에서 위선의 냄새를 맡게 되면서부터였다.
뭔가, 이 영감은 유복한 귀족 가문에 태어나서 젊은 날의 모험 같은 약간의 신산함을 겪은 둬 자신의 영지(領地)에 틀어박혀 당시 최고의 원고료와 대우를 받으며 한평생 잘살다 간 주제에 좋은 말은 혼자 다 하고 있다. 한 끼 고기 없는 식사를 한 것을 쓴 고행인 양 여기며 서둘러 갈아입은 거친 베옷과 핏기 없는 화장으로 사도(使街)를 맞아들인 초기 기독교 시절의 로마 귀부인 같은 표정으로 온갖 심각한 말은 다 하고 있지만 실제 그가 한 일이란 막대한 수입에 비해서는 푼돈에 지나지 않는 보시를 이따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뿌린 것뿐이다. 대개 그런 논리에서였다.
그림1 1908년 5월에 야스나야 폴랴나에서 찍은 톨스토이의 유일한 컬러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잘 알려진 ‘감염이론’ 위상에도 자주 도스토예프스키와 비교
나중에 그의 감염이론(感染理論)은 사회적 리얼리즘 쪽에서도 중시할 만큼 실천적이었고, 그도 피상적인 이해와는 달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진지하게 선(善)을 향한 의지를 불태웠음을 인정하게 된 뒤에도 그런 내 편견은 좀체 씻어지지 않았다. 그 절정이 1980년대 말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가 아닌가 한다. 아직 사회주의적인 심성을 다 털어내지 못한 그곳 사람들에게서 느낀 그의 위상 때문이었는데 특히 도스토예프스키와 비교될 때 그랬다.
평생 가난했고 문학적으로도 인정 못받고 죽은 도스토예프스키

도스토예프스키의 삶은 때로 자초하기도 했지만 일생 가난하고 고단했다. 원고료는 언제나 가난에 허덕이며 써대다 보니 같은 매수라도 톨스토이의 절반에 못미칠 때가 많았다. 사회적인 대우도 원고료와 비슷하게 절하되어 받았다. 그런데 그때 모스크바에서 내가 받은 느낌은 그런 부당한 대우가 죽은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원인을 그들이 죽은 뒤 오래잖아 들어선 공산주의 정권에 돌렸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불행은 그가 ‘악령’을 통해 드러낸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의심스러운 눈길을 경직된 공산주의 정권이 악의로만 해석한 데 있다고 보았다. 그에 비해 톨스토이의 선의지(善意志)는 대부분 추상적이고 일반화되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사회주의의 이상을 분식(粉飾)하는 데 차용될 수 있었다.
서민과 달리 풍족했던 톨스토이에 대한 의구심
그러자 이번에는 톨스토이에 대한 또 다른 의심이 들었다. 언제나 민중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던 그의 삶은 풍족하고 평온하였기에 혁명의 기운에 관대할 수 있고 때로는 관념적인 지지조차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사회주의에 동조하여 사형대에 서본 경험이 있고, 고통스러운 시베리아 유형을 거쳐 작가로 입신한 뒤에도 줄곧 민중적인 삶과 밀착되어 살아온 도스토예프스키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거기다가 도스토예프스키에게는 이미 무슨 불길한 전조처럼 사회 전반에 번져 있는 혁명의 기운에 불안과 의심을 드러낼만한 근거도 있었다. 톨스토이는 그윽한 영지에 은거해 살며 추상적인 민중에 대한 연민을 길러갔다. 거기 비해 도스토예프스키는 도시의 뒷골목에 살며 바로 곁에서 신음하고 한탄하는 현실의 민중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들 민중의 몽매함 혹은 준비 부족만큼이나 혁명만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건달, 사기꾼, 비렁뱅이, 덜렁뱅이들의 광기와 폭력성을 잘 볼 수 있었기에 ‘악령’으로 자신의 의심과 불안을 드러냈는지도 모른다.
그러자 톨스토이의 선의지는 검증받지 않은 이상주의거나 위선의 혐의가 들었고 심하게는 편의주의거나 세상 눈치 보기였는지도 모른다는 의심까지 일었다. 우리 사회주의 도입 초기의 양반 지주 출신의 운동가들과 마찬가지로 요란한 1960년대의 씨를 뿌린 5, 60년대의 유학파들 일부에게서도 느끼는 감정이다. 그들은 저마다 유학 시절의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그 결핍과 고통의 5,60년대를 이 땅에서 몸으로 떼워낸 민중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사치스러운가. 그들이 그토록 열렬하게 민중을 외쳐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민중이 그만큼 추상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지울 수가 없다.
한때 검증 안된 이상주의, 위선 가득한 공허한 우화로 오해
젊어 시건방졌던 시절에 읽은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톨스토이의 그 같은 검증받지 않은 이상주의 혹은 위선이 빚어낸 공허한 우화였다. 더군다나 성경의 인용만으로 채워진 도입부는 또 고색창연하다 못해 치명적인 흠집으로 느껴졌다. 그런데 이 몇 년 사이 내게 무슨 변화가 온 것일까. 이제 다시 읽어보니 ‘그래도 사랑할 만한 인간’이라는 이 책의 표제에 더할 나위 없이 잘 들어맞는 가작으로 다가온다.
오히려 ‘환상적 리얼리즘’ 가까운 단정한 우화…세계문학의 ‘산맥’ 톨스토이
우화적이라고 단정한 기법을 오늘날의 환상적 리얼리즘으로 변호해줄 수 있다면 그가 그려낸 것은 당대의 그 어느 작가보다 사실적인 러시아 민중의 삶이며, 땅으로 추방된 천사는 그 민중들에게 남아 있는 희망을 증명해주는 환상적인 소도구(小道具)일 뿐이다. 고색창연한 도입부도 선(善)을 향한 진지한 열정의 표출을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이런 시대에는 오히려 이채(異彩)를 띤다.
작가 톨스토이는 러시아 문학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문학에서 보아도 하나의 웅장한 산맥이다. 그의 사상은 문학을 뛰어넘어 20세기 전반의 정치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친 만큼 그에 관해 알고 싶은 사람은 따로 시간을 내기 바란다.